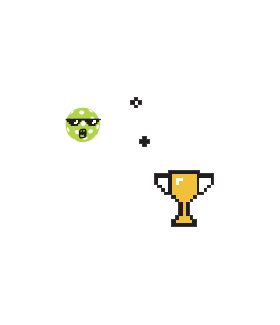스포츠는 짧은 장면으로 달린다 팬들을 사로잡은 ‘밈’의 시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방식이 변하고 있다.
특히 경기 장면이나 선수의 인터뷰 장면 등에 재미 요소를 더한 ‘밈’을 창조, 전파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경기보다 더 오래 회자되기도 하는 ‘스포츠 밈’에 대해 이야기한다.
글. 김영재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팬, 밈 크리에이터가 되다
“어제 손흥민 선수 봤어? 골도 멋졌지만, 경기 후 인터뷰할 때 머쓱해하던 표정, 정말 귀엽지 않았어?” 현대 스포츠 관람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팬들은 더 이상 경기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대신 ‘밈(meme)’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경기의 여운을 나누고, 웃음을 공유하며 독특한 팬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밈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장면이나 표현을 유머러스하게 변형하거나 모방한 콘텐츠를 의미한다. 원래 문화 전파 현상을 설명하는 학술 개념에서 시작됐지만, 현재는 일상의 재미있는 순간을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표현하는 온라인 유머로 정착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골 후 인터뷰에서 보이는 쑥스러운 미소에 ‘고백 후 차인 내 표정’이라는 전혀 다른 상황의 자막을 덧붙이는 식이다. 하나의 장면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팬들의 창의적 해석을 통해 새로운 웃음 콘텐츠로 재생산된다. 경기의 하이라이트보다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선수들의 자연스러운 표정, 예기치 못한 해프닝, 감정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찰나의 순간들이다. 팬들은 이제 단순한 관람객을 넘어 장면을 편집하고 텍스트를 추가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는 ‘밈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

-

-
밈은 경기보다 오래 간다
골 장면은 시간이 흐르면 기억에서 흐려질 수 있지만, 골을 넣은 후 미끄러지며 세리머니를 하던 장면은 오랫동안 회자된다. 팬들에게 각인되는 것은 점수보다도 감정이 폭발했던 그 순간일 가능성이 크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벤투 감독이 퇴장 후 경기장을 떠나는 모습은 수많은 SNS 계정에서 ‘영화 엔딩 같은 퇴장’이라는 캡션과 함께 광범위하게 화제가 됐다. 이처럼 밈은 스포츠와 유머,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게 융합된 새로운 문화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밈은 단순한 웃음 제공을 넘어 팬들이 경기를 회상하고 감정을 공유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선수들도 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미국 NFL의 패트릭 마홈스는 자신을 소재로 한 밈을 보며 “밈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친근하게 느끼게 됐다.”라고 언급했다. 일부 유럽 클럽들은 밈 전담 스태프를 운영하며, 경기 중 포착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편집해 재미있는 콘텐츠로 배포한다. 이는 젊은 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전략이자, 구단과 팬 간의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이 되고 있다. 서울시체육회의 유소년 리그나 생활체육 현장에도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농구 경기에서 3점슛 성공 후 독특한 세리머니를 선보인 참가자에게 ‘이 분, 커리 후계자설’이라는 캐릭터가 붙어 소셜미디어에서 수천 회 이상 공유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
생태계 전략으로 활용할 차례
밈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스포츠를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문화적 연결 고리가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결코 일회성 소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팬들은 밈을 통해 스포츠를 더 깊이 기억하고, 더 오래 사랑하며, 더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스포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스포츠를 시민의 일상과 감정 속으로 끌어들이는 문화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밈은 바로 그 상상력의 매개체다. 짧은 장면 하나에도 다양한 감정이 스며들고, 한 문장에 웃음과 공감이 녹아드는 그 순간들이 모여 스포츠 팬 문화를 구성한다.미래의 스포츠는 단지 승부와 결과보다 누가 더 많은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가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 밈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언어다. 앞으로 스포츠가 경기장을 넘어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여정이 되기를, 그리고 그 여정에 더 많은 이들이 웃으며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